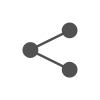|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에 죽전(수원)에 헤세드 성경 신학원에 강의하러 오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는 살짝 차가운 기운이 들어 히터를 약하게 틀어야 하네요. 오가면서 들녘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아니 일주일이 다르게 맞겠네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목요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물론 저는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름 정도만 알았지, 아직 그의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입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그는 [소년이 온다], [희랍어 시간], [채식주의자] 등의 많은 소설들을 섰더군요. 저는 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야 우리말의 진가를 알아주는가보다”였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말의 아름다운 표현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평가받지 못하고 영어로 번역하다보니 그 아름다운 말씨가 밋밋해져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란색만하더라도 ‘노란 색’, ‘누런색’, ‘누리끼리 한 색’, ‘샛노란색’, ‘연노란색’, ‘노릿노릿한 색’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색감이 다르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외국어로는 ‘노란색’, ‘짙은 노란색’, ‘옅은 노란색’이 끝입니다. 색감뿐만 아니라, 맛을 표현하는 것도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는 ‘맛있다.’, ‘맛없다.’, ‘시다’, ‘달다’, ‘쓰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달짝지근한 맛’, ‘담백한 맛’, ‘시원한 맛’, ‘새콤한 맛’, ‘감칠맛’ 등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시각적 표현’과 ‘맛’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서 ‘욕설’이 너무 잘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와 침략, 그리고 억눌림이 그만큼 심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억눌림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억눌림의 무게를 욕설로 풀어내려 했던 습성이 그대로 현대에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은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외국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정서가 외국인들에게도 먹히는 가봅니다. 한동안 K-Pop의 영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여시는 문으로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도 선교의 문과 세상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회복하게 하는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Place H. Cross 열린쉼터 & 열린공간의 오픈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모시는 말씀
주안애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자치 단체를 위한 열린쉼터와 열린공간을 오픈합니다. 부디 귀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전시 서구 배재로 107-11, 1층(주안애 교회 건너편)
- 담당 : 주안애 교회 조용희 전도사(042-531-7749, 010-2561-2719)